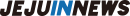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시민으로 함께 사는 제주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논평 자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한 부분이다. 타고났거나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든 관계없다. 사람은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갖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제도에서 존중은 존재의 인정과 최저 생계의 보장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1981년에 UN이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고, 이후 대한민국과 UN은 각각 장애인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UN의 경우는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과 UN의 장애인의 날은 이렇게 목적이 다르다. 그 목적의 차이가 한국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날 목적은 장애를 재활과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아 장애를 타자화시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런 타자화는 <장한 장애인상>과 지금은 사라진 <장애우>라는 낱말로 나타났다. 누구도 성인에게 장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자신과 평등하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는 친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도 그렇다.
장애인의 날에 필요한 것은 장하다며 하대하듯 칭찬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차별과 차별의 배경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이 필요하다. 당사자에게는 권리의 인식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힘을 싣는 행동,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이해와 사회적 장벽을 제거(Barrier-free)하기 위한 연대 행동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장애를 동정적으로 보고, 극복의 대상으로 본다. 장애인 주간을 맞아 영화관의 협조를 얻어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홍보했는데, 이는 기회를 줬으면 끝이라는 안일하고 형식적인 정책이다.
제주도내 영화 상영관에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석이 드물거나 없을 뿐 아니라, 상영관 내에 계단만 있어 휠체어 관람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좌석에 앉기 힘들다. 장애인 주간에 상영하는 영화조차도 시간표를 보아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자체가 없다. 무료 관람기회를 제공해도 이렇게 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 정체성의 장애인이 많다.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가 장애 정체성의 활동을 막고 있음을 인식하여 사회와 행정의 장애인 정책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건축물과 시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장벽을 철폐하는 배리어 프리 정책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0일